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문의 게시판 입니다.
KCTC 소식
| 30분이면 우울증·치매·종양 진단 가능 | |||
|---|---|---|---|
| 첨부파일 | 조회수:1344 | 2004-03-23 | |
| 2004-03-22/조선일보 뇌의 각 부분 기능 표시한 ‘지도’ 그리기 한창 불안하고 머리가 어지러운 환자가 걱정 끝에 병원을 찾는다. 약 30분의 검사 뒤,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진단된다. 정신분열증 0.7%, 우울증 5.4%, 불안장애 31.4%, 뇌종양 0%. 그동안 환자가 뇌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도 진단서에 나타난다. ‘내부 감정이 신경회로의 작동을 방해 중. 정보를 처리해서 결과로 도출하는 시간이 평균 이상.’ ‘뇌 지도’가 완성되면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모습이다. 최근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뇌의 영역마다 기능과 관련 정보를 표시, 하나의 지도(地圖·map)로 그려내고 있다. 우리의 생각과 기억이 결정되는 경로를 손에 쥘 수 있는 그림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뇌 지도가 왜 필요한지는 우리가 쓰는 지도의 역할을 생각하면 알기 쉽다. 지도는 단순히 지형을 나타낼 뿐 아니라 강수량, 기온, 인구밀도, 범죄율 등 무수히 많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뇌 지도’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학자 간 연구결과 교환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인간의 뇌가 영역마다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19세기부터 있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뇌를 관통할 수 있는 라이플이 사용돼, 후두엽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시각에 장애가 오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했다. 1950년대에는 초보적인 뇌 지도가 그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뇌에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된 것은 CT(computed tomography·컴퓨터단층촬영),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양전자방출단층촬영),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자기공명영상) 등이 개발된 뒤이다. 지리학자들이 측량과 정밀한 항공사진으로 지도를 만들듯이, 뇌과학자들은 CT·PET· MRI를 사용해 뇌 지도를 만든다. 이들은 70년대부터 뇌 내부의 피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해 인지신경과학(cognitive neuroscience)이라는 새 학문을 열었다. 인지신경과학자들이 성과를 올린 대표적인 분야가 시각 연구이다. 90년대 연구자들은 PET와 MRI를 통해 멈춘 물건과 움직이는 물건을 봤을 때의 뇌 혈류량을 찍어냈다. 결과는 놀랍게도 동일했다. 모든 실험 대상자들은 움직이는 물건을 본 뒤 하부 뒤쪽 뇌 피질이 활성화됐다. 최근 연구자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자세한 뇌 지도를 그려냈다. 이들은 망막에 투사된 시각정보가 시신경을 통해 대부분이 일차 시각 피질(V1)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피질에 전달된 시각 정보가 V1과 연결된 많은 다른 피질(V2·V3A·V4·MT)로 분산되고, 시각적 주의력(attention), 작동기억(working memory), 운동 계획(motor planning)을 담당하는 회로를 형성한다는 결과까지 추가로 뇌 지도에 ‘그려넣었다’. 우리가 어떻게 물건을 볼 수 있는지 기본적인 회로가 밝혀진 셈이다. 과학자들은 이 지도를 더욱 자세히 그려, 최근 시각을 실제로 인식하는 회로가 어디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뇌 지도 작성 작업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부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소뇌는 운동이나 자세 조절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사물을 인식하는 기능도 소뇌에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이 같은 연구가 계속되면, 철학이나 종교의 영역에 있던 인간의 인식·의식의 문제도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뇌 지도 연구 성과는 매년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뇌 연구자 간에 정보를 통합할 필요성도 절실해지고 있다. ICBM(International Consortium for Brain Mapping)이 대표적인 사례. ICBM은 미국·일본·유럽 선진국의 대표적인 뇌영상 센터들이 모여 18세에서 90세 사이 정상 성인집단의 인간 뇌 지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1992년부터 7000여명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대 정신과학교실, 핵의학교실, 한양대 의공학교실 등이 모여 ‘한국인의 표준 뇌 지도’를 작성 중이다. 한국인의 뇌 지도가 필요한 이유는 뇌의 구조와 기능의 변이가 인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 현재 일부가 작성돼 있으며, 5월 중순쯤이면 작성된 지도가 발표될 예정이다. 뇌 지도가 완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질병과 연관있는 뇌의 영역이 밝혀지면, 영상만으로 뇌질환을 세세하게 진단할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있는지도 뇌 영상을 보면 파악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의사는 환자에게 ‘정신분열증입니다’라고 진단하는 대신, ‘유전적으로 내측두엽 해마 세포의 발달이 취약해 곧 정신분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고 진단할 수 있다. 또 정신질환, 노인성 치매 등의 질환을 진단하는 것도 보다 간단해질 전망이다. <백승재기자 whitesj@chosun.com> (이 기사는 권준수 서울대학교 의과대 의학과 정신과학교실 부교수의 도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이전글
 통합주의 생물학뜬다
통합주의 생물학뜬다 - 다음글
 복잡·방대한 정보 뇌는 단순화해 기억
복잡·방대한 정보 뇌는 단순화해 기억
 MICROBIOTA
MICROBIO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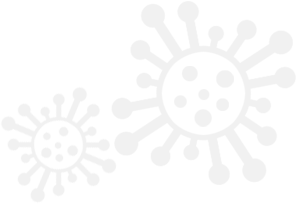



 담당자
담당자 기탁/분양서류
기탁/분양서류 DNA분양서비스
DNA분양서비스 동결건조서비스
동결건조서비스 STR분석서비스
STR분석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