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문의 게시판 입니다.
KCTC 소식
| 통합주의 생물학뜬다 | |||
|---|---|---|---|
| 첨부파일 | 00500000012004032301465264.jpg(10223Bytes) | 조회수:1482 | 2004-03-24 |
| 2004-03-23/한겨례 지난 5일 발행된 저명한 국제 생물학술지 <셀>에 흥미로운 논문 한 편이 실렸다.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 유전자가 발현되어 단백질이 생성되는 연속과정을 미국의 콜드스프링하버연구소 연구팀이 실시간 동영상으로 처음 포착했다는 내용이다. 세포 안의 생명현상 세계최초로 동영상에 담아 7초 분량으로 인터넷(genomenewsnetwork.org)에도 공개된 동영상은 응축된 유전자가 점차 풀리면서 아르엔에이가 만들어지고, 세포핵 밖으로 나온 아르엔에이를 통해 특정 단백질이 생성되어 세포 안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연구팀은 디엔에이와 아르엔에이, 단백질이 스스로 빛을 내게 하는 형광기술을 이용해 분자의 움직임을 담아내는 데 성공했다. 권기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단백질체시스템연구센터 책임연구원)는 이와 관련해 “유전자 발현과 단백질의 생성 과정을 모두 동영상에 담은 것은 세계 처음”이라며 “이 연구는 디엔에이 따로, 단백질 따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생명현상의 전 과정을 통합해 이해하려는 새로운 생물학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21세기 들어 세계 생물학계에 새로운 흐름으로 나타난 통합주의 생물학은 ‘시스템 생물학’ ‘네트워크 생물학’ 등으로도 불리고 있다. 지난 1950년대 이후 디엔에이, 아르엔에이, 그리고 단백질들에 관한 연구성과들이 쌓이면서, 이들을 아우르는 전체 시스템으로 생명현상을 이해하자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등장하고 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이제 숲을 바라보자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무엇보다 생명현상을 실제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DNA-단백질등 별개아닌 ‘생명 시스템’으로 이해 생명현상 가상세포로 구혀 ㄴ신약개발등 활용 노력 권 박사는 “특정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그것이 세포 안에서 언제 어디에서 발현되며 어떤 단백질이 어느 곳에 있을 때 작용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해로운 단백질의 이동을 언제 어느 곳에서 차단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만을 공격하는 효과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데에 시·공간의 정보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김규원 서울대 교수(약학)도 “세포 안에선 암세포가 생존하도록 돕는 어떤 단백질은 세포 밖에 나오면 도리어 암세포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며 “단백질이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우리몸에 끼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생물학에 시·공간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시공간을 다루는 물리학·수학의 개념이 생물학에도 쓰이고 있다. 단백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루는 ‘단백질의 동역학’이나 ‘시공간의 벡터’ 등 용어는 통합주의 생물학에서 자주 등장한다. 같은 유전자 단백질도 시·공간 따라 성격 달라져 통합주의 생물학은 완전한 ‘가상세포’의 구축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디엔에이, 아르엔에이, 단백질과 대사물질들의 네트워크에 관한 데이터를 컴퓨터에 모두 집어넣어 자연에 가까운 생명현상을 컴퓨터 안에서 구현해보자는 것이다. 가상세포 연구자인 김영창 충북대 교수(생명과학부)는 “유전자·단백질과 생명현상을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가상세포는 세포 안에서 실제 일어나는 생명현상 전체를 구현하려는 세포 모형”이라고 말했다. 가상세포는 홀로 존재하는 유전자·단백질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를 실제에 가깝게 이해하게 하며 신물질이 세포에 끼치는 약효나 독성을 즉시 파악하는 데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가상세포 연구는 일본·미국에서 한창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에선 지난해부터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이 가상세포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해 6월 과학기술부 지원으로 ‘시스템생물학연구사업단’(단장 김도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이 발족해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사업단장인 김 교수는 “시스템 생물학의 새로운 접근방법은 기존의 분자생물학과 보완의 관계를 이루며 발전할 것”이라며 “앞으로 3년 동안 기초연구의 바탕을 마련하고 이후 신약 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연구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53년 디엔에이 이중나선 발견 이후 생물학의 발전을 이끌어온 분자생물학과 더불어 통합주의 생물학이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 |||
- 이전글
 화성 표면에 한때 바다 존재
화성 표면에 한때 바다 존재 - 다음글
 30분이면 우울증·치매·종양 진단 가능
30분이면 우울증·치매·종양 진단 가능
 MICROBIOTA
MICROBIO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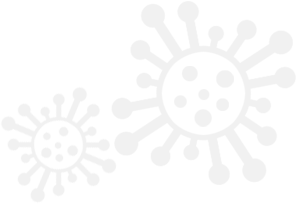



 담당자
담당자 기탁/분양서류
기탁/분양서류 DNA분양서비스
DNA분양서비스 동결건조서비스
동결건조서비스 STR분석서비스
STR분석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