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문의 게시판 입니다.
KCTC 소식
| 생태계 절대강자는 없다 | |||
|---|---|---|---|
| 첨부파일 | 조회수:1597 | 2004-04-07 | |
| 2004-04-06/한겨레 생태·진화이론의 새 모델 ‘가위바위보’ 가위, 바위, 보! 무엇을 내느냐에 따라 승패는 확연히 갈린다. 그런데 가위바위보의 묘미가 이에 더해 하나 더 있다. 승패는 있지만 절대 승자도 절대 패자도 없다. 바위는 가위를 이기지만 보자기엔 맥없이 진다. 바위 앞에서 고개 숙이는 가위는 보자기를 간단히 잘라버린다. 끝없이 물고 물리는 가위바위보는 그동안 심리·사회학과 수학 등에서 행동심리, 게임이론 등 모습으로 종종 탐구대상이 돼왔다. 더 나아가 가위바위보 게임의 확산을 꾀하는 세계가위바위보회(WRPS)는 가위바위보를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이용하자는 이색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최근엔 진화생물학에서도 가위바위보의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가위바위보가 지구 생물종들이 어떻게 다양성을 유지하는지를 설명하는 생태·진화이론의 모델이 된다는 이런 주장은 몇 년 새 권위 있는 학술지에 관련 논문이 잇달아 실리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저명한 과학저널 〈네이처〉는 최근호(3월25일치)에서 “생물의 치열한 경쟁은 자주 한 종이 다른 종을 지배하는 것으로 귀착되는데도 지구 생물종이 이토록 다양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라며 “생물 다양성을 가위바위보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네이처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미국 예일대학 벤저민 커컵 박사 연구팀은 서로 다른 대장균 종들이 벌이는 증식경쟁에서 가위바위보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실험용 생쥐들의 내장에 서로 다른 대장균 3종을 넣어 이들의 증식경쟁을 살폈다. 하나는 ‘콜리신’이라는 독소(항생물질)를 내어 다른 종을 억누르며 자신의 증식을 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 독소에 민감하게 반응해 사멸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콜리신에 저항성을 지닌 것이다. 미생물 세계에서 증식경쟁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실험용 생쥐들의 분비물을 관찰한 결과, 모두 한가지 종의 대장균이 각 생쥐 내장의 생태계에서 ‘나홀로 지배자’가 됐지만 지배 종은 생쥐 내장마다 각기 달라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콜리신 독소를 만드는 대장균은 콜리신에 매우 약한 대장균 종을 물리치고 우점종이 된 뒤엔, 콜리신에 저항성을 지닌 대장균에 의해 밀려난다. 그렇다고 저항성 대장균이 최종 승자는 아니다. 저항성 대장균은 콜리신이 없어지자마자 매우 빠르게 증식하는 콜리신 민감성 대장균에 의해 생활 터전을 잃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김승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생물자원센터 책임연구원)는 “콜리신 생산 대장균 → 콜리신 저항성 대장균 → 콜리신 민감성 대장균 → 다시 콜리신 생산 대장균처럼 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우열의 관계는 가위바위보의 이치와 흡사하다”며 “일대일 관계에선 강자와 약자만이 존재하지만 생태계의 다자관계에선 강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마뱀의 수컷들이 벌이는 번식경쟁에서도 가위바위보 게임이 발견된다. 미국 코넬대학의 켈리 자무디오 박사 연구팀은 2000년 12월 〈미국과학아카데미회보〉(PNAS)에 낸 논문에서 ‘얼룩무늬도마뱀’ 3종이 펼치는 다른 번식전략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찾아냈다. 여기엔 넓은 텃세권을 차지하며 여러 암컷을 거느리는 오렌지빛 도마뱀 수컷, 일부일처와 자기 보금자리를 알뜰하게 지키는 푸른빛 도마뱀, 그리고 집 없이 떠돌다가 몰래 남의 보금자리에 잠입해 암컷들에게 자신의 정자를 퍼뜨리는 노란빛 도마뱀이 등장한다. 과연 누가 자기 종의 유전자를 더 많이 퍼뜨리려는 번식경쟁에서 최종의 승자일까. 일부 진화이론을 따른다면, 더 넓은 텃세권을 차지하고 많은 암컷들을 거느린 오렌지빛 도마뱀이 절대 승자가 될 공산이 클 것이다. 하지만 자연생태계에선 사정이 다르다. 텃세 넓히기에 골몰하는 공격적인 오렌지빛 도마뱀은 곧잘 푸른빛 도마뱀의 일부일처 보금자리를 위협한다. 하지만 더 큰 텃세와 더 많은 암컷을 지닌 오렌지빛 도마뱀은, 노란빛의 암컷처럼 위장·침투해 자기 종을 퍼뜨리는 떠돌이 도마뱀의 공격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반면에 일부일처 도마뱀은 떠돌이 도마뱀이 침입할 빈틈을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생태계의 가위바위보 모델과 관련해, 천종식 서울대 교수(생명과학부)는 “생물의 상호관계는 그동안 대체로 일대일 관계에서 설명됐다는 점에서 가위바위보의 삼자 관계는 좀더 진전된 생태 모델”이라며 “하지만 동물의 내장에 사는 세균만 해도 500여종에 이를 정도로 실제의 생태계는 매우 복잡해 가위바위보 이론은 여전히 생태계의 일부만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 |||
 MICROBIOTA
MICROBIO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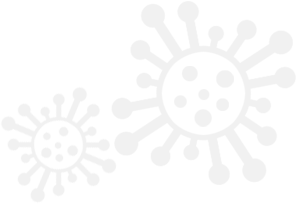




 담당자
담당자 기탁/분양서류
기탁/분양서류 DNA분양서비스
DNA분양서비스 동결건조서비스
동결건조서비스 STR분석서비스
STR분석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