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문의 게시판 입니다.
KCTC 소식
| 출연연 과학자로 산다는 것 | |||
|---|---|---|---|
| 첨부파일 | 조회수:1324 | 2004-03-04 | |
| 2004-03-02/대전일보 뉴스 75년부터 5년간 국내 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당시 민간연구소의 실험실은 변변한 실험 장치가 전무하던 시절이다. 한번은 4일 밤을 거의 뜬눈으로 실험 생산을 했다. 당연히 사고가 발생했다. 실험실을 나서다 정신이 혼미해지며 대형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친 것이다. 유리파편이 얼굴과 가슴 손 등에 박혀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다. 지금도 그 흉터가 남아있다. 80년 회사를 그만두고 박사과정을 거친 후 83년 화학연구원에 입사했다. 화학연을 택한 것은 민간기업이나 대학보다 연구 환경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사정은 달랐다.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연구비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인건비를 연구원들이 확보해야만 했다. 연구원들이 자신의 인건비를 확보하기위해 ‘연구 과제’ 세일즈를 해야 하는 형국이다. 조금 나았던 시기가 있었다. 장기 국책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던 1992년쯤이다. 이른바 G-7 프로젝트로 불리던 선도기술개발 사업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었다. 중간단계 연구결과가 우수해도 참여기업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과제가 중단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98년 IMF 금융위기때가 최대 위기였다. 수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기업에 참여를 호소하고 때로는 다른 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해 보따리 장사를 해야만 했다. 출연연의 과학자들은 바쁘다. 연구 활동 때문 만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연구비가 인건비의 30-40% 정도인 데서 오는 스트레스다. 나머지 인건비는 기업이나 정부에서 연구 과제를 수주해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인이나 공무원들에게 ‘연구과제’ 좌판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21년간 연구소에 몸담아 왔다. 그동안 정식 휴가 일수를 따지면 30일이 채 되지 않는다. 단 하루도 휴가를 내지 못한 해도 있다. 그렇다고 직업을 바꾼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과학자가 천직이란 것을 알기 때문이다. 피곤하기는 하지만 이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다. 최길영 (선임부장) | |||
 MICROBIOTA
MICROBIO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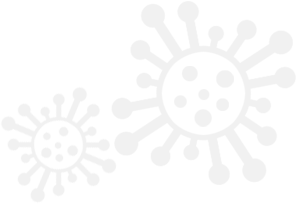




 담당자
담당자 기탁/분양서류
기탁/분양서류 DNA분양서비스
DNA분양서비스 동결건조서비스
동결건조서비스 STR분석서비스
STR분석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