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문의 게시판 입니다.
KCTC 소식
| 고양이가 사탕보다 생선을 좋아하는 이유 | |||
|---|---|---|---|
| 첨부파일 | 조회수:1591 | 2005-08-01 | |
| 2005년 7월 31일(일) 사이언스타임즈 대표적인 애완동물인 개와 고양이. 둘은 수천년 전부터 길들여져 왔지만 습성은 꽤 다르다. 개는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며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반면 고양이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세이면서도 도도한 모습을 잃지 않은 모습이 매력이다. 식성도 차이가 있다. 사람과 입맛이 비슷한 개와는 달리 고양이는 여전히 육식만을 고집한다. 아이스크림 맛을 본 개는 주인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옆에서 입맛을 다시지만 고양이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왜 고양이는 입 안에서 살살 녹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외면하는 걸까. 사실 고양이뿐 아니라 사자나 호랑이 등 고양이과(科)에 속하는 동물들이 보이는 별난 식성은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 녀석들은 달콤한 먹거리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 맹물과 설탕물을 두면 사람(실험 대상은 아이들)뿐 아니라 개, 쥐 등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맛을 본 뒤 달콤한 설탕물을 택한다. 이는 진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연한 일. 달콤하다는 것은 칼로리가 높은 영양분, 즉 탄수화물이 풍부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고양이과 동물들은 이런 신호를 무시하게 된 걸까. 화학적 감각인 후각과 미각을 연구하는 미국 모넬 화학적 감각 센터의 조셉 브랜드 박사팀은 고양이가 맹물과 설탕물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단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유전학 분야의 온라인 저널인 '플로스 지네틱스' 7월호에 발표했다. 기본적인 맛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감칠맛이 그것이다. 사람을 포함한 대부분의 포유류가 이들 맛을 모두 느끼는데 유독 고양이과 동물들은 진화상의 어느 시기에 이 가운데 단맛을 느끼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 연구자들은 단맛에 관여하는 수용체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를 조사했다. 단맛이 느껴지려면 설탕 같은 분자가 물(침)에 녹은 상태에서 세포막에 붙어 있는 단맛 수용체 분자에 달라붙어 그 신호가 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돼야 한다. 따라서 고양이과 동물들이 보이는 이상한 행동은 단맛 수용체에 문제가 생긴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 연구자들의 예상은 적중했다. 단맛 수용체는 T1R2라는 단백질과 T1R3라는 단백질이 결합된 형태인데 고양이과 동물의 경우 T1R2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 따라서 아무리 진한 설탕물이라도 고양이에게는 맹물과 마찬가지로 느껴질 뿐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언제 이런 능력을 잃어버렸을까. 이것과 육식성을 갖게 된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연구자들은 고양이뿐 아니라 사람, 생쥐, 쥐, 개 등의 해당 유전자를 비교한 결과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고양이가 T1R2 단백질은 못 만드는 것은 그 유전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돌연변이로 유전자 중간의 정보가 떨어져나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 이처럼 작동하지 못하는 유전자를 '가짜유전자'(pseudogene)라고 부른다. 연구자들은 이런 돌연변이가 고양이과 동물의 공통조상에서 일어났다고 추측했다. 집고양이뿐 아니라 같은 고양이과에 속하는 호랑이와 치타의 유전자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발견됐기 때문. 분류학적인 관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분류학적으로 과(科)의 윗 단계는 목(目). 고양이과는 식육목에 속한다. 식육목에는 개나 늑대가 속한 개과와 곰이 속한 곰과도 들어있다. 개과는 물론 곰과의 동물들도 단 걸 좋아한다. 곰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꿀이라고 할 정도다. 연구자들은 따라서 고양이과에서 단맛을 상실한 시점은 식육목의 분화가 일어난 이후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고양이과에서 단맛 수용체의 또 다른 파트너인 T1R3는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 T1R3는 단맛뿐 아니라 감칠맛에도 관여하기 때문. 감칠맛은 글루탐산 같은 아미노산의 맛으로 역시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의 함유 여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미각의 하나다. 감칠맛 수용체도 두 개의 단백질이 결합한 형태인데 T1R1과 T1R3가 그들이다. 따라서 단백질이 풍부한 육식을 고집하는 동물인 고양이에게 감칠맛 수용체 단백질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렇다면 고양이과 동물에서 단맛 수용체 상실이 먼저일까 육식 고집이 먼저일까. 즉 단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자 과일이나 뿌리의 맛을 모르게 돼 영양이 없다고 판단해 육식만 하게 된 것일까 아니면 육식만 하다보니 단맛을 느끼는 유전자가 고장나도 생존에 지장이 없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연구자들은 단맛을 느끼는 능력의 상실이 고양이과 동물의 엄격한 육식성을 발달시키는 데 계기가 된 것 같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 |||
- 이전글
 배아복제 연구 첫 승인
배아복제 연구 첫 승인 - 다음글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성과 '합격점'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성과 '합격점'
 MICROBIOTA
MICROBIO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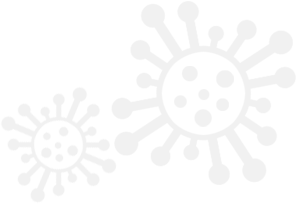



 담당자
담당자 기탁/분양서류
기탁/분양서류 DNA분양서비스
DNA분양서비스 동결건조서비스
동결건조서비스 STR분석서비스
STR분석서비스